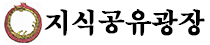<공동선 경제>는 가능한가?
지금 유럽에서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시도가 진행 중이다. <공동선 경제(Economy for the Common Good)>가 바로 그것이다. <공동선 경제>는 “소수의 부를 증식시키는 데 기여하는 대신 다수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설계된 윤리적인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작가이면서 현재 비엔나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크리스티안 펠버(Christian Felber)다. 펠버는 1972년생이니 2010년에 이 운동을 추진했을 때 불과 38세의 젊은이였다. 이 운동의 성패를 떠나 이런 신선한 시도를 한 그의 용기와 추진력에 찬사를 보낸다. 사실 유럽은 유럽연합으로 통합된 이래 이런저런 후유증으로 고전해왔다. 그럼에도 독일을 비롯한 중심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는 이런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활발하게 유지되어온 협동조합의 전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펠버는 저서 『Change Everything』에 <공동선 경제>의 핵심 메시지를 잘 정리해 놓았다. 아직 우리말로 번역되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공동선 경제>의 기본 원리는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윤추구와 경쟁에 기반을 둔 경제 대신에 공동선과 협력을 추구하는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 자본주의 패러다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대다수인 현실에서는 사실상 실천하기 어렵다. 이런 원리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경제의식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펠버는 이 운동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2010년 오스트리아에서 12개 기업의 지지를 받으며 시작했는데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약 50개 나라, 2,200개가 넘는 기업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짧은 역사를 감안할 때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여러 대학과 공기업들, 그리고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그의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경제·사회 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법체계에 이 운동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여기서 <공동선 경제> 운동이 왜 그리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동선(common good)의 의의에 대해 잠깐 생각해보자.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잠시 공동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 계기는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하버드대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제공하였다. 이 책에서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미덕과 공동선을 장려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주장했다. 공동체주의자인 샌델에게 공동선을 회복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런데 공동선 개념은 정치철학에서 오랫동안 쟁점이었으며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해왔기에 공동선의 내용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인해 공동선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배경이 있기에 펠버는 이런 운동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리라.
그러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공동선 경제>와 유사한 아이디어조차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도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고려할 때 <공동선 경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운동을 추진할 바탕이 전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홍익인간(弘益人間),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을 구현하려 했다. 부족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침략과 약탈을 일삼던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높은 의식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어느 사회에서나 유효한 가장 보편적인 공동선에 해당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문화적, 의식적 기반이 없다고 자학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이를 실천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을 뿐이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거해 판단할 때 자본주의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대미문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은 반박하기 어렵다. 인류역사에서 지금처럼 풍요로웠던 시대는 없었으며 이것은 자본주의의 미덕에 해당된다. 그런데 지금은 효율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미덕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불평등의 심화,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른바 과유불급(過猶不及), 즉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고사가 지금 자본주의의 상황을 단적으로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이기심과 경쟁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원리는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공동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고 펠버는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공동선이란 간단히 말해 “사회 구성원 모두 또는 대다수가 공유하면서 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평과 정의의 권장, 용감한 행동에 대한 포상, 제한적 불평등 추구 등은 공동선의 덕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선이란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공동선은 추상적인 가치를 표방한다는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또한 공동선은 절대불변의 가치가 아니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경제 분야에 한정하는 경우 공동선은 상황에 따라 다른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의 비조(鼻祖)인 애덤 스미스가 강조했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도 적절한 경제적 상황에서는 공동선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스미스는 유일하게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은유를 사용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본국 노동의 유지에 사용하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수입이 가능한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된다.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의도하지도 않고, 자신이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애덤 스미스의 이 말에는 별도의 공동선을 주장하는 것이 별다른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선적이라는 경고가 담겨있다. 공동선이란 곧 공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빙자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공동선을 운위하는 자체가 위선적임은 틀림없다. 애덤 스미스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제조업이 가내수공업을 대체하고 있었지만 시장을 지배할 정도의 거대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들 간 경쟁이 충분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 상황에서는 별도로 공공선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비유적으로 “우리가 저녁을 즐길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업자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각자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보이지 않은 손”이 알아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실현하므로 별도로 공공선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시장원리를 통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분배 문제는 이상적인 시장경제에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의 경제는 애덤 스미스가 생각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 마디로 “보이지 않는 손”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거대한 초국적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수익률만 추구하는 막강한 금융자본이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자본주의라는 기본 틀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은 극단적인 형태의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문제가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모색하려는 운동이 제기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2010년과 2012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80~90퍼센트의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질서를 원한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펠버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선 경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깊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펠버가 『Change Everything』 에서 주장한 아이디어들 가운데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공동선 대차대조표(common good balance sheet)” 개념이다. 이것은 기업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 연대(連帶), 정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측정하려는 것이다. 펠버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곧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기에 이런 기준에 입각해 기업을 평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즉 이를 이용해 전통적인 대차대조표 개념에 의존해 기업을 평가하는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다.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주체들, 즉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기업이 공동선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법인세와 관세 등을 차등 적용하고,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우선권을 부여하며, 은행은 이자율에 차등을 두는 등 대출조건을 완화해줌으로써 기업들이 이윤극대화 대신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그럼으로써 시장에서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이 <공동선 경제>의 강력한 추진 세력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이 아이디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등 진보적인 학자들은 주주가치만 중시하는 풍토로 인해 많은 경제적 문제들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관계자가치를 추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해관계자가치를 추구하는 데는 개념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천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펠버가 제시한 “공동선 대차대조표” 개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널리 수용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셈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미래는 기업에 더 많은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나노기술 등 정보기술에 바탕을 둔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 “공동선 대차대조표”의 개념을 수용한다면 인류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